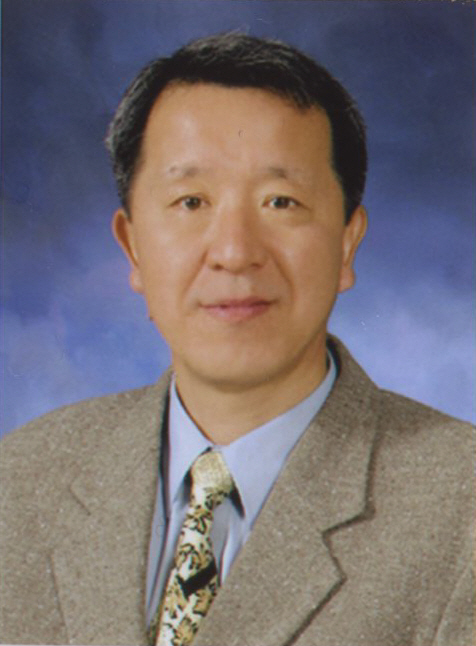
[한국농어촌방송/경남=정용우 서울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 객원교수(전 학부장)]올해에는 고향에서 추석 명절을 보냈다. 고향으로 돌아오기까지 참 오랜 시간이 걸렸다. 나이 들어 은퇴하고 나서야 그것이 가능해진 것이다. 10여일 넘게 가을장마가 이어지더니 추석을 맞아 그야말로 청명한 가을하늘이다. 광풍제월(光風霽月). 비 온 뒤 선선한 바람과 함께 구름이 열리며 드러난 환한 달을 만난다. 달빛으로 인해 2차선 포장도로가 제법 훤히 보일 정도이다. 기온마저 걷기에 안성맞춤이니 휘영청 밝은 보름달을 마음껏 즐길 수 있었다. 자신의 뿌리를 찾아 고향에 온 사람들도 나처럼 밝은 달 아래서 아스팔트 포장길을 이리저리 거닐고 있다. 고향에서 맛볼 수 있는 큰 즐거움이다.
여기에 덤으로 나를 즐겁게 해 주는 것이 있다. 반딧불이(개똥벌레라고도 함)다. 지방도에서 우리 마을까지 연결된 도로 약 300~400미터 구간 사이에 예로부터 반딧불이가 많이 눈에 띄는 것을 보면 아마 이 근처에 반딧불이 서식지가 있는 모양이다. 추석 보름달, 그 밝음 속에서 반딧불이가 발산하는 빛은 고혹적이다. 날아다니기도 하고 나무나 풀에 꼭 붙어 있는 놈도 있다. 하늘에는 밝은 달이 휘영청 빛나고 아래 땅에서는 반딧불이가 역시 빛을 발하고 있다. 참 환상적이다.
반딧불이 하면 형설지공(螢雪之功)을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다. 반딧불과 눈빛을 등잔불 삼아 공부해 이룬 공이다. 진(晉)의 차윤(車胤)이 반딧불이를 주머니에 잔뜩 잡아넣어 그 불빛으로 공부해 상서랑(尙書郞)이 되었고, 손강(孫康)은 겨울에 눈을 옆에 두고 책을 비쳐 보며 공부해 어사대부(御史大夫) 벼슬에 이르렀다는 고사에서 나온 말이다.
형설지공을 떠올리면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본다. 꽁지에 불이라도 붙은 것처럼 바쁘게 갔다왔다하는 우리네 일상. 그런데도 정작 이렇다 하게 이룬 것 없이 마음속에는 경쟁에서 낙오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과 공허감만이 늘어갈 뿐인 삶.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기도 하다. 스마트폰만 껴안고 있지 도대체 책은 가까이 하지 않는다.
형설지공이라는 사자성어에서도 보듯이 옛사람들은 가난한 상황 속에도 정말 열심히 공부했던 것 같다. 이 사자성어에 대해 요즘 세상에서 볼 때 좀 과장된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그때 상황으로 보면 그다지 과장된 것 같지는 않다. 그때는 책이라는 것이 붓으로 베껴 쓴 것이니까 반딧불이가 뿜어내는 빛을 모아서도 읽기가 가능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보다도 더 중요한 사실에 착안해 본다. 옛사람들은 책 구하기가 어려워 일단 획득한 책은 두고두고 몇 번이나 읽어 거의 외다시피 했다는 점이다.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으면 외우는 수준까지 갔을까. 거의 외우다시피 했으니 반딧불이의 빛으로도 독서가 가능했을 것이다.
지금까지 전해오는 각종 기록에 의할 것 같으면 실로 옛사람들의 책 읽기는 혀를 내두를 정도였다. 정민 교수가 쓴 ‘책 읽는 소리’라는 책에 보면 한 예로 김득신이라는 분의 독서 회수가 기록되어 있는데 정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 김득신 자신이 즐겨 읽은 옛글 36편의 읽은 횟수를 꼼꼼히 기록해 놓았는데 이에 의하면 각 책마다 만 번을 넘지 않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 그것도 소리 내어 읽었다. 이렇게 리듬을 타면서 소리 내어 읽다보면 어느 순간 의미가 들어오게 된다는 사실을 터득했기 때문이다. 물론 독서의 주된 목표는 자신의 내적 기쁨, 내적 충실이다. 이 분들에게 있어 독서란 세상을 읽고 나 자신을 옳게 아는 안목을 기르는 일이었다. 정말 대단한 분들이다. 우리는 이런 독서량이나 독서의 목표에 접근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하다. 두보(杜甫)가 형화(螢火)라는 시에서 표현한 것처럼 ‘차윤(車胤)의 책에 다가가는 것만을 만족해 하리’… 산책 중에 반딧불이 빛을 보고 즐기면서 나도 집에 가서 동양(서양 책 보다는 큰 소리로 읽기에는 안성맞춤)의 옛 고전 하나 꺼내어 소리 내어 읽어보아야겠다는 욕심이 생겨났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달과 반딧불이를 번갈아 보며 몇 차례 더 왕복해서 걷는다. 그러다 보면 반딧불이도 쉴 시간이 된다. 나도 모르는 사이 유영을 즐기는 반딧불이 개체수가 확 줄어든다. 제법 오랜 시간 걸었던 터라 나도 약간의 피곤함을 느꼈다. 이때쯤이면 귀가한다. 귀가한 후 ‘노자(老子)’를 꺼내 소리 내어 읽는다. 책 제본이 약간 파손될 정도로 여러 번 읽어 눈에 익숙한 책이다. 한 단락 읽고 달 한 번 쳐다보고…. 책장에 쓰인 죽어 있던 단어들이 날개를 달고 훨훨 날아올라 의미화되는 느낌을 받는다. 한없이 평화로운 추석날 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