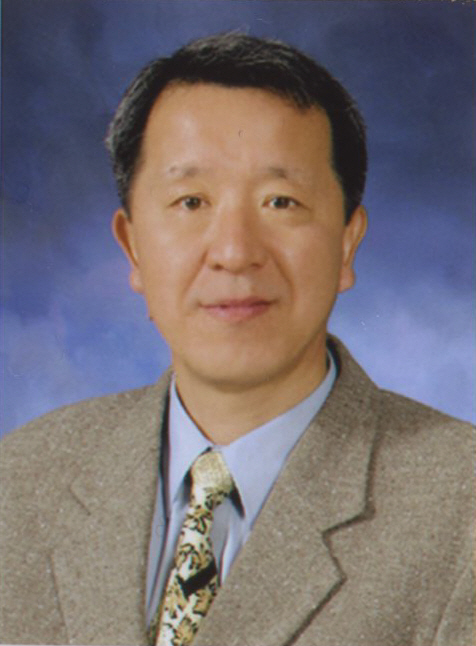
[한국농어촌방송/경남=정용우 서울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 객원교수(전 학부장)] 연말연시, 이즈음이면 내가 즐겨 부르는 노래 하나 있다. 학명선사의 선시다. 학명선사는 다음과 같이 노래했다. ‘묵은 해니 새해니 분별하지 말게/겨울 가고 봄이 오니 해 바뀐 듯하지만/보게나 저 하늘이 달라졌는가/우리가 어리석어 꿈속에 사네’ 어제도 내일도 없이 그렇게 ‘영원한 오늘’을 사라는 이야기. 결코 무엇 무엇을 하겠노라고 미리 계획을 세우지도 말고 지난날에 대해서 후회하거나 미련도 두지 않 그저 날마다 그날 하루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는 것에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두는 것. 한마디로 순간순간을 만족하면서 살아가라는 뜻일 게다. 한결같은 삶이다.
그러나 우리네 보통사람들의 삶이 어디 그렇게 마음먹은 대로 되던가. 내가 세상 속에 살고 있고 또 시간 속에 사는 한 어쩔 수 없이 세상의 흐름에 따를 수밖에 없으니. 그 중 하나가 ‘새해인사’ 메시지를 주고받는 일이다. 휴대폰 만능시대, 휴대폰 신호음과 함께 화려한 연하장 화면이 무시로 떠오른다. 그믐날 뜨는 해와 설날 뜨는 해가 다르지 않음을 알면서도 굳이 구획을 지어 떠들썩하게 의미를 부여해온다. 그렇게 해서라도 구태를 훌훌 떨쳐버리고 새 희망을 맞이하고 싶은 모두의 마음이 담겨 있을 테니. 사연이 담기지 않은 그걸 누가 반기겠는가하고 그냥 무시할 수도 없다. 설렘이니 기다림이니 하는 감정 따위가 별로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서 허울뿐인 예법이라고 내팽개칠 수만도 없다. 이 또한 세상살이이니 나 자신도 시류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연하장에 대한 답신을 보내야만 한다. 답신을 보내되 휴대폰에 올라온 새해인사 동영상이나 사진을 ‘공유’해서 타인에게 보내지는 않는다. 최소한의 사연과 성의를 담아 편지를 쓰거나 아니면 전화 통화를 해서라도 근황을 물어보고 안부를 전한다. 이러다 보니 새해가 되면 나름 홍역을 치른다. 해가 바뀌면서 몇 날을 그렇게 보냈다.
이제 이 번잡함에서 어느 정도 벗어난 셈이다. 여기저기서 넘칠 정도로 접했던 ‘희망찬 새해’도 나의 뇌리에서 조금씩 사그라져 간다. 그렇다고 하여 내가 ‘희망’이라는 단어를 경원시하는 것은 아니다. 어느 정도의 희망은 필요하다. 희망을 갖는다는 것은 살아 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일뿐더러 어느 정도는 세상살이에 힘이 되고 또 실제로 도움이 되기도 한다. 희망이란 마음 밭에 뿌리는 씨앗과 같아서 한 번 뿌려지면 스스로 자라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다시 새로운 희망을 만들고…, 그런 의미에서 해가 바뀌면서 나도 나름대로의 희망을 가져본다.
그런데 나의 희망은 거창하지 않다. 아주 소박하다. 소박하기 때문에 내 희망을 이루기 위해 타인의 몫을 빼앗거나 타인과 충돌하지 않아도 된다. 가족 및 주변 사람들과 잘 지내기. 건강과 행복을 해치는 나쁜 습관 없애기. 내가 머문 곳 깨끗이 청소하기. 밝은 표정으로 주변사람과 인사하기 등등. 내가 품는 대부분의 새해 희망은 너무 지나치지도 않고 너무 부족하지도 않은 높이의 희망이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들처럼 크고 무겁지 않은 정도의 희망들. 희망이 너무 크거나 무거우면 이루기도 어렵겠지만 자칫 잘못하면 희망이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갖는 희망이다.
이런 희망과는 달리 많은 세상 사람들은 크고 무거운 희망을 품기를 좋아한다. 크고 무거운 희망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타인의 몫을 빼앗거나 타인과 충돌해야 한다. 많은 돈과 힘센 권력을 희망하는 경우가 그러한 예다. 하기야 그런 것들도 희망은 희망이니, 이때의 희망은 욕망을 부드럽게 표현한 것에 불과한 것일지도 모른다. 이런 욕망에 가까운 희망은 우리가 쉽게 벗어날 수 없는 족쇄가 된다. 희망의 포로. 희망의 포로가 된 채 싸우고 지지고 볶는다. 이런 세상은 지옥이다. 여기서 벗어나는 길은 ‘지금 여기’에 만족하는 삶이다. 그래서 희망의 반대말은 절망이 아니라 자기만족임을 알 수 있겠다. 주어진 조건을 조용히 받아들이면서 그 속에서 만족하며 사는 삶. 만족은 또다시 감사로 이어질 테고.
칠레의 시인 겸 가수인 비올레타 파라(Violeta Parra)는 노래했다. ‘내게 이토록 많을 걸 준 삶에 감사합니다. 삶은 내게 흑과 백을 구분하고, 하늘에서 빛나는 별을 볼 수 있는 두 눈을 주셨습니다.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내 사랑하는 이의 소리를 듣도록 두 귀를 주셨습니다. - 삶에 감사합니다 Gracias A la Vida)‘에서 일부 발췌’. 새해를 맞으면서 나이를 한 살 더 먹었기 때문일까. 이 노래의 여운이 유독 길게 느껴진다.

